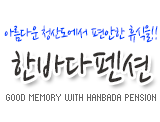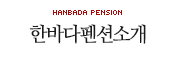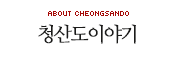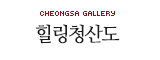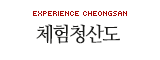초분
2008.08.04 15:17
| extra_vars1 | |
|---|---|
| extra_vars2 |
21. 초분(草墳) | |||||||||||||||||||||||||||||||||||||||||||||||||||||||||||||||
| |||||||||||||||||||||||||||||||||||||||||||||||||||||||||||||||
중부매일 jb@jbnews.com | |||||||||||||||||||||||||||||||||||||||||||||||||||||||||||||||
| |||||||||||||||||||||||||||||||||||||||||||||||||||||||||||||||
부모 죽은후 바로 매장하면 불효 초분은 대개 짚으로 엮어 만든 용마름과 이엉으로 만드는데 이삼년 후에 다시 해체해 씻골을 한 다음에 최종으로 땅에 묻는 본장을 한다. 이렇게 초분을 만드는 것은 초분을 통해 최종으로 죽음을 확인하고 뼈를 깨끗이 씻어 묻음으로써 다음 세상에 재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또한 초분은 아직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초분 곁에서는 잠을 자도, 산소 곁에서는 자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이엉으로 관을 돌려 감싸 올리고 최종으로 용마름을 올려 초가집 지붕을 얹듯이 줄로 엮어 매고 사방으로 끈에 돌려 묶어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마무리 한다. 그리고 초분 주위를 생솔가지로 울타리를 만든다. 날짐승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초분의식이 모두 끝나면 보통 초분을 한지 3년 정도 지나면 시신의 오물이 다 빠지고 탈육이 잘 되어 뼈만 남아 이장할 수 있다. 이장은 주로 한식이나 윤달을 택해 하는데 날은 보통 지관과 상의하지만 사자의 운에 따라 정하게 된다. 초분을 해체하기 전에 간단히 고유제를 지내고 해체하여 유골을 확인한 후에 탈육된 유골을 골라서 깨끗이 씻는다. 깨끗해진 유골을 창호지 위에 머리부터 목, 팔, 몸, 다리, 발끝까지 차례차례로 맞추어 염(殮)하듯이 다시 묶는다. 그리고 이것을 묘지까지 옮겨 매장을 하면 모든 순서가 끝나는 것이다. 이러한 초분의 관행은 장례를 두 번 모시는 번거로움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거의 볼 수 없지만, 마지막 통과 의례인 상장례 문화를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다. / http://www.songbonghwa.net | |||||||||||||||||||||||||||||||||||||||||||||||||||||||||||||||
| |||||||||||||||||||||||||||||||||||||||||||||||||||||||||||||||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필독~!!! 청산도 갤러리와 동영상, 자유게시판에 글쓰는 방법입니다...^^ [1] | 한바다 | 2014.04.02 | 60635 |
| 1541 |
아쉬운/청산도를등지고집으로.........
| 000 | 2005.08.16 | 3056 |
| 1540 |
아! 5월의 청산도여...
| 김선규 | 2005.07.22 | 3054 |
| 1539 |
청산도 공예점
| 고래지미 | 2011.06.27 | 3053 |
| 1538 |
2005바캉스(08)
| 손상익 | 2005.07.22 | 3053 |
| 1537 |
해설
| 최미순 | 2010.08.05 | 3051 |
| 1536 |
청산도의 여름
| 고래지미 | 2008.07.31 | 3051 |
| 1535 |
좌로 눕고 우로 쓰러진 바위
| 한바다 | 2004.11.07 | 3050 |
| 1534 |
산보 !
| 헌터 | 2005.08.22 | 3045 |
| 1533 |
오로라
| 한바다(펌) | 2009.01.12 | 3044 |
| 1532 |
슬로푸드
| 김송기 | 2011.02.15 | 3043 |
| 1531 |
휘리 체험
| 김송기 | 2009.08.08 | 3043 |
| 1530 |
대물
| 바캉스 | 2005.08.16 | 3043 |
| 1529 |
무당버섯
| 김소정 | 2004.12.20 | 3043 |
| 1528 |
지석묘
| 한바다 | 2004.11.13 | 3043 |
| 1527 |
청산도의 보리밭
| 한바다 | 2005.03.21 | 3042 |
| 1526 |
한바다 민박집 전경
| bublle | 2007.05.11 | 3042 |
| 1525 |
2005여름휴가
| 한바다 | 2005.08.02 | 3040 |
| 1524 |
감독님 가족
| 김송기 | 2007.05.17 | 3040 |
| 1523 |
오랜만입니다.
| 김송기 | 2005.08.22 | 3039 |
| 1522 |
코스모스
| 한바다 | 2004.11.07 | 3039 |